고성 활동 최동훈 철학박사
1년간 건봉사 머물며 쓴 수필
소크라테스 관련 인문서 발간
오대산 혜수스님 비교한 글도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 자신을 아느냐”고 질문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선문답과 같은 산파술로 ‘무지(無知)의 지(知)’를 통찰하는 소크라테스의 고백은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으로서 자각을 강조하는 불교의 핵심과 통한다. 어쩌면 소크라테스와 불교는 서로 닮아있는지도 모른다.
고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양 출신 최동훈 작가가 1500년 역사를 가진 최북단 사찰 건봉사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소재로 두 권의 책을 연달아 펴냈다. 철학박사인 작가의 경력과 그의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책들이다.
먼저 ‘주지스님과 종두 이야기’는 국내 최북단 사찰 고성 건봉사에서 1년간 머물며 있었던 일화를 수필 형식으로 쓴 글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며 작가가 여러 편의 한시와 함께 직접 쓴 글들로 구성됐다. ‘종두’는 종을 치는 소임을 맡은 승려를 뜻하지만 작가는 스님이 아니다.

불교적 사유와 사상에 대한 단상을 적은 짧은 글들의 연속이다. 깊은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통해 잠시 마음의 여유를 주는 동시에 주지스님과 실없는 농담을 주고 받는 모습이 웃음을 안긴다. 무작정 절에 찾아와 글방을 달라는 모습부터 범상치 않다. 성탄절을 맞아 “나무 할렐루야! 나무 크리스마스!”와 같은 말들로 인사를 나눈다.
밤에도 앉아서 수행의 시간을 쌓았던 오대산 상원사 혜수스님과 소크라테스를 비교하는 문장도 눈길을 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계에 좌탈입망(오랫동안 참선 수행을 한 노스님이 앉은 자세나 선 자세에서 열반하는 것)할 선사 한 명이 없다는 혜수스님의 말에 누군가 “스님은 좌탈입망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차를 들고 있는 채로 입적했다는 일화가 울림을 전한다.
“빛이 보이지 않을 때/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때/삶의 여정은 이 자체로도 좋다”는 후기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안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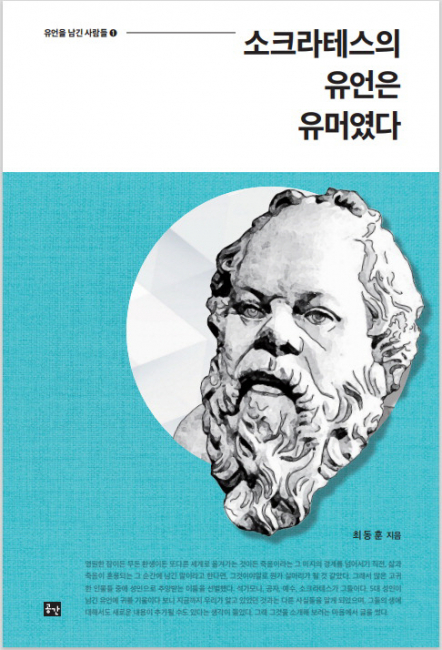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분석한 작가의 인문서 ‘소크라테스의 유언은 유머였다’는 출판사 공간이 발간하는 ‘유언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의 첫 책이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우린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 주게나” 친구 크리톤에게 남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에 흥미를 느낀 저자는 그의 유언이 유머였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흥미를 가졌다고 한다. 저자는 “남들처럼 변명하고서 사느니보다는 할 말을 하고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시니컬한 유머를 툭툭 내뱉는 소크라테스의 어법을 밀도있게 분석했다.
책은 소설식과 논설식으로 색다르게 구성됐다.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하루’라는 부제로 소크라테스가 숨을 거두는 과정을 상상력을 가미해 전개했다. 사형의 위기 속에서도 탈출을 거부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소크라테스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를 두고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매력은 그의 괴짜 기질과 유머 감각, 지혜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개성과 해학, 지혜가 샘처럼 넘쳐나는 철학가였다는 것이다.
출판기념회는 27일 오후 2시 고성 달홀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김진형 formati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