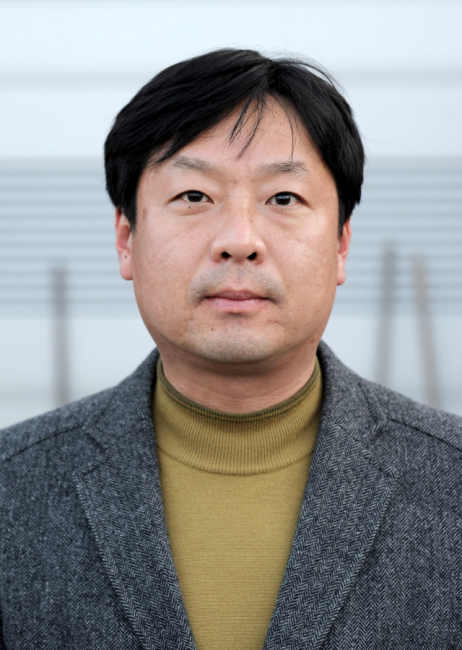
얼마 전 양구를 찾았다. 지난해 2월까지 양구주재 기자로 있다가 춘천 본사로 발령된 이후 10여개월 만에 업무차 방문했다. 간만에 찾은 양구의 도심은 코로나19 장기화 탓인지 거리는 한산하고 삭막한 풍경이 왠지 쓸쓸했다. 점심약속을 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국도 31호선 서천 방향 상리 일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기자가 주재할 당시만 해도 이곳은 약 1㎞에 달하는 완충녹지에 수십년 된 자작나무와 느티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도심의 쉼터 역할을 하던 곳이다. 하지만 10개월여가 흐른 지금 완충녹지에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콘크리트 도로가 완충녹지를 관통하고 있었고 하얀 속살을 드러내던 자작나무는 집단 고사해 흔적조차 없었다. 고사돼 잘려 나간 느티나무 그루터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고 2∼3년생 이팝나무 묘목이 고사된 자작나무의 빈공간을 대신해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지인은 지난해 여름 보행자 도로 개설 구간에 포함된 20∼30년된 수십그루의 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푸념 섞인 듯 하소연했다. 기자가 곧바로 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인의 얘기 그대로였다.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었다. 통상 여름에는 일반적인 나무도 이식하지 않는 것이 조경업계의 불문율이다. 조경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작나무는 이식 자체가 쉽지 않은 수종으로, 속칭 ‘아작나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높다. 지인인 강릉원주대 조경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자작나무의 경우 봄, 가을 적기에 이식할 때에도 잔뿌리를 모두 잘라내고 노출을 최소화한 뒤 곧바로 이식해야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여름에는 자작나무를 아무리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식을 하더라도 10그루 중 8∼9그루는 ‘아작’이 난다며 무모한 ‘여름이식’을 꼬집었다.
국어사전에 ‘아작’은 조금 단단한 물건을 깨물어 바스러뜨릴 때 나는 소리로 부사어다. ‘아작나다’는 말은 깨지고 망가지다라는 뜻의 전라도 말로 표기돼 있다. 자작나무가 아작날 정도로 뻔한 예견된 상식을 공무원들이 보행자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상식에 벗어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주민들은 애초부터 살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 보행자도로라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다 어쩔 수 없이 고사했으니 감수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위에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일반인이 수십년 된 나무를 죽이고 잘라냈다면 형사고발을 당했을 텐데 완충녹지에서의 만행(?)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인사교류 때마다 양구에 내려와 근무했던 부군수들의 얘기가 불현듯 스쳤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는 도청과 달리 일선 시군에서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 마지못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양구는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속에 재산권 침해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군장병이 줄어들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점점 더 피폐해진 모습을 견디기 어려워 떠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다. 리더를 뽑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새로운 리더는 국민과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자작나무의 무모한 ‘여름이식’처럼 아작나지 않도록 공적 업무의 세심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