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8년(성종9년) 4월1일 흙비(土雨)가 내렸다. 전에 없던 천재지변이었다. 지진에 이어 하늘이 보낸 경고였다. 왕과 조정은 몸을 잔뜩 낮추고 전전긍긍했다.
성종이 승정원을 질책했다. “흙비가 내렸으니 하늘이 내리는 벌이 가볍지 않다. 수나라 황제가 산을 뚫고 땅을 파며 급하지 않은 역사(役事)를 하자 흙비가 내렸다. 당시 ‘백성의 원망이 흙비를 부른 것’이라고 했다. 대신들은 어찌 한 마디 말도 없는가?”
좌부승지 손비장(孫比長)이 답했다. “옛 성왕(聖王)과 철왕(哲王)은 재이(災異)를 만나면 두려워했는데 전하도 직언을 들어 하늘의 벌에 답하고자 하니 훌륭하십니다.”
성종이 의정부에 하명했다. “덕이 없고 어리석은 내가 한 나라에 임하여 공경하고 부지런하며 임무를 다하지 못할까 두려웠다. 그런데 지진에 흙비도 내리니 어찌 연유가 없겠는가? 세금이 과중했는가? 공역(工役)이 많았는가? 형벌이 적중하지 못했는가? 인사가 잘못됐는가? 어질고 준수한 인재가 등용되지 않았는가? 수령을 살펴 내쫓거나 중용하는데 잘못이 없었는가? 모든 허물은 내게 있다. 직언을 들어 답하고자 한다. 지진이 나고 흙비가 내린 연유와 이를 그치게 할 방법을 숨김없이 전하라.”

엿새가 흘러 4월7일 경연에서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왕의 하명에 답했다.
대사간 김자정(金自貞) = “두 번 흙비의 변(變)이 있어 전하께서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하여 이를 삼가시면서도 금주(禁酒)는 허락하지 않으시니 하늘에 공경히 답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헌부 장령(掌令) 박숙달(朴叔達)이 입을 열었다. “지금 공경대부는 잔치하고 노는 것을 일삼아 강 위에 정자를 짓고 즐깁니다. 대소 관리도 잔치를 베풀며 기생과 광대를 청해 놀고 희롱합니다. 강가 정자를 헐게 하고 기생과 노는 잔치를 금하게 하소서.”
성종 = “당나라에서도 재상이 곡강(曲江)에 나가 노는 일이 있었으니 일 년 동안 근심하고 수고했는데 하루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대신들 = “지당하십니다.”
박숙달 = “‘역경(易經)’에 ‘신하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시경(詩經)’에도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한 사람을 섬긴다’고 했으니 경대부(卿大夫)는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잔치하며 술마시는 것을 일삼는 것이 옳겠습니까?”
성종 = “태평시대에 공경대부가 어찌 항상 근심하고 걱정만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나치지 아니함이 옳으며 비록 놀고 휴식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박숙달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태평시대에 임금과 신하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태평함을 길이 보전하는 길입니다. 만약 스스로 태평시대라고 이르며,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르면 어찌 태평함을 보존하겠습니까?”
대신들이 말머리를 돌렸다. “모여서 술을 마시는 법을 세웠으니 사치를 금하는 법도 세워서 거듭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성종 = “법을 세웠으니 검찰(檢察)만이 있을 뿐이다. 술을 금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
박숙달이 화제를 바꿔 말을 이어갔다. “신이 강원도에 가서 보니 토지가 메말라 백성들은 농사를 힘쓰지 않고 목재를 팔아 사는데 이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니 예전에는 산림천택(山林川澤)을 백성들과 공유했습니다. 국가에 이미 금산(禁山)이 있으니 그 외 산들은 금하지 말게 하소서.”
성종 = “그렇지 않다. 금산 이외에 어찌 금함이 있겠는가?”
박숙달이 한 발 더 나아갔다. “신이 보건대 전하의 다스림이 점점 처음과 같이 못합니다. 창원군(昌原君)이 사람을 죽여 신 등이 죄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정인지(鄭麟趾)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하여 군상(君上)을 속였으므로 신 등이 죄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또 허종(許琮)의 죄를 청했으나 따르지 아니하시니 전하께서 언론(言論)을 듣는 것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합니다.”
임금이 참다못해 신하들에게 물었다. “대간(臺諫)의 말은 반드시 다 따라야 하는가?” 대신들이 “주상께서 취하거나 버리시면 됩니다.”라고 답했다.
성종 = “허종은 대신이고 또 공신인데 어찌 죄를 가할 수 있겠는가?”
그대로 물러설 박숙달이 아니었다. “우통례(右通禮)는 승직(陞職)해 좌통례(左通禮)로 삼은후 거관(去官)하게 하는 것이 예(例)인데 지금 신윤저(申允底)는 우통례로 거관하였으니 신은 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바로 잡으소서.”
성종 = “신윤저를 이 벼슬에 제수한 지 이미 오래됐다. 처음에 좌통례에 제수했어야 마땅한 것을 이조(吏曹)에서 우통례에 잘못 제수한 것이다.”
박숙달이 따지고 들었다. “신윤저는 재주와 덕은 없고 단지 문음(門蔭) 때문이었으니 통례에 제수된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승직하여 좌통례로 삼은 연후에 거관하게 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아니합니다.”
성종이 얼굴을 붉히며 단호하게 잘랐다. “마땅히 써야 할 것이어서 쓴 것인데 어찌 문음(門蔭)을 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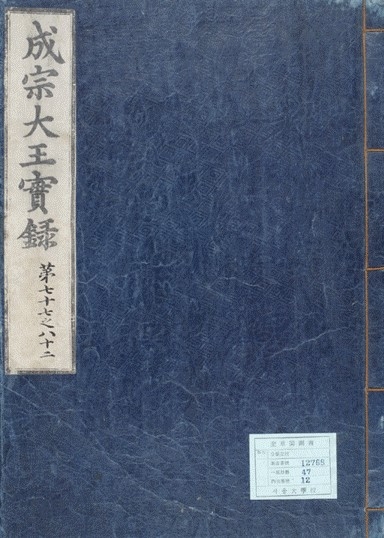
이날 성종과 정(正) 4품관 박숙달 사이의 날 선 공방은 일곱 번이나 이어졌다. 스물한 살 성종의 인내와 경청의 자세가 놀랍다. 하지만 왕과 대신 앞에서 소신을 굳히지 않고 조목조목 진언하는 사헌부 장령 박숙달의 기개와 용기는 더 놀랍다. 영락없는 조선 제1의 언관(言官)이었던 것이다.
그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세조8년(1462년) 과거에 급제해 세조11년 사관으로 경연에서 논어(論語)를 강했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7년(1476년) 사헌부 지평, 2년후 사헌부 장령, 그리고 끝으로 1481년 사헌부 집의로 봉직했다.
생전, 그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성종12년(1481년) 8월12일 사헌부 집의 박숙달이 병으로 사직했다. 성종이 친히 글을 써(御書) 이르기를 “마음이 곧아서 가히 쓸 만한 사람이다. 우선 한가한 벼슬로 바꾸어라. 내가 나중에 특별히 중용하겠다.”
언관으로서 직분에 충성을 다했던 박숙달과 그 곧은 마음을 읽고 각별하게 아꼈던 성종. 547년 전 왕과 신하의 신화 같은 이야기다.
남궁창성 미디어실장








![[속보]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등 5명 무더기 기소…위증 고발사건 방치 등 혐의](https://cdn.kado.net/news/thumbnail/custom/20251126/2018850_821225_0621_1764122781_120.jpg)



![[영상] 강원도민일보 '창간33주년 기념식'](https://cdn.kado.net/news/thumbnail/custom/20251126/2018843_821220_5521_1764122121_120.jpg)
